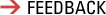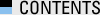이달 초에 니카노르 파라가 세르반테스 상을 수상했다. (관련 스페인어 기사는 A님의 번역을 참고.) 니카노르 파라는 볼라뇨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시인이었다. [괄호 치고]에서는 보르헤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작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파라의 수상을 기념하는 의미로 볼라뇨가 파라에 대해 언급한 에세이를 찾다가 이 글을 골랐는데...
다음 글은 2001년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니카노르 파라의 전시회 카달로그 서문에 씌었던 글... 이라고 하는데, 분위기상 구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구어체로 옮겼다. 좌우간 중요한 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맥락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니카노르 파라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선 제목부터 의아하다. 원제는 Ocho Segundos con Nicanor Parra. 굳이 해석하자면 '니카노르 파라와의 8초'. 하지만 segundo라는 단어에 속마음, 본심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이 글이 총 여덟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서 '니카노르 파라에 대한 여덟 가지'라고 의역을 했는데... 틀려먹은 게 아닌가 싶다. -_- 혹시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덧글로 좀 알려주세요. 뿌잉뿌잉. 그밖에도, 전반적으로 망한 것 같... OTL
니카노르 파라에 대한 여덟 가지
니카노르 파라의 시와 관련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세기에도 살아남을 거라는 점이죠. 물론 이 말은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파라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아차렸죠. 어찌됐건, 그는 살아남을 거예요. 보르헤스의 시, 바예호의 시, 세르누다의 시, 그리고 다른 몇몇 시인들의 시와 함께 말이죠. 말할 필요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파라의 내기, 파라가 미래를 향해 투시했던 관측기는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어두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배우는 완벽하게 볼 수 있죠. 그의 특징이나 그의 복장, 종양처럼 덧붙는 상징들은 일상적인 거예요. 그는 의자에서 파묻혀 자고 있는 시인이에요. 공동묘지에서 길을 잃은 미남이기도 하고요. 머리카락을 다 뽑을 때까지 머리칼을 쥐어뜯고 있는 강연자이기도 하죠. 감히 무릎을 꿇고 오줌을 누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슬픔에 빠진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파라를 읽기 위해선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을 거예요. 파라 스스로가 했던 질문,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이죠. "이 손은 손인가 아니면 손이 아닌가?" (이 질문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손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파라가 생각은 했지만 결코 쓰지 않았던 그 책을 누가 쓸지 말이에요. 전쟁 이후의 전쟁, 강제 수용소 이후의 강제 수용소를 말하고 노래하는 2차 세계 대전의 역사에 관한 책. 네루다의 총가요집Canto general를 즉각적으로 뒤집어버리는 어떤 형태의 시. 파라가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텍스트인 선언문el Manifiesto, 거기엔 자신의 시적인 신념이 드러납니다. 파라 자신이 필요하다고 믿을 때마다 무시했던 것과 똑같은 바로 그 신념이죠.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정확히 이 이유 때문에 신념이 있는 겁니다. 탐험되지 않은 영토에 대한 공허한 이상을 주기 위해서말입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진정한 작가들은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뚜렷한 위기나 위험의 시간이 오면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죠.
용감한 사람이라면 파라를 따를 겁니다. 젊은이들만이 용감하죠.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젊은이들만이 그래요. 하지만 파라는 청소년용 시를 쓰지는 않았어요. 순수함에 대해서 쓰지도 않았죠. 고통과 고독에 대해서 썼습니다. 쓸모없으면서 필요한 다툼에 대해서 썼어요. 마치 분열될 운명에 처한 부족민들처럼, 분해되어버릴 운명에 처한 어휘들에 대해 썼죠. 파라는 다음날 전기의자에서 사형 당할 사람처럼 글을 썼어요. 멕시코 시인 마리오 산티아고는, 제가 아는 한, 파라의 작품을 명민하게 이해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검은 별똥별을 봤을 뿐이죠. 걸작의 최우선 조건은 주목받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겁니다.
시인은 살아가는 동안, 즉석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는 다른 대책이 없을 때가 생깁니다. 비록 그 시인이 곤살로 데 베르세오에 대한 명성을 읊을 능력이 있거나, 가르실리아소의 7음절 시와 11음절 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심연으로 몸을 던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교양 있는 듯한 칠레인들 일당 앞에서 벌거벗은 채 맞서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물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죠. 걸작의 최우선 조건은 주목받지 않은 채 지나가는 거니까요.
정치적인 메모입니다. 파라는 계속 생존해왔습니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니지만 의미있는 일이죠. 우파를 굳게 믿었던 칠레 좌파들도, 신 나치 칠레 우파들도 파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신 스탈린주의 라틴아메리카 좌파들도, 현재 세계화되고 있고 최근까지 억압과 대량학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라틴아메리카 우파들도 파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학 캠퍼스에서 우글거렸던 라틴아메리카의 하찮은 교수들도, 산티아고의 작은 마을에서 어슬렁거리는 좀비들도 파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라의 추종자들조차 말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열정에 의해 행했다는 겁니다. 파라뿐만 아니라 비올레타(*니카노르 파라의 여동생, 작고)를 필두로 한 그의 동료들, 그의 선조격인 라블레주의자들은 모든 시대 시의 최고 야망 중 하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대중의 인내심에 엿을 먹이는 것이었죠.
닥치는 대로 파라의 구절을 발췌해볼게요. "별들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파라가 말했습니다. 성인군자의 말보다 일리가 있어요. "다른 말을 해보자면, 나는 당신들에게 영혼은 불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다." 성인군자의 말보다 일리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건 파라는 조각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쥬얼 아티스트죠. 이런 명확한 설명은 완전히 쓸모없을지 몰라요. 파라는 또한 문예 비평가입니다. 칠레 문학사를 세 줄로 요약하기도 했죠. "위대한 네 명의 칠레 시인은 / 세 명이다 / 알론소 데 에르시야와 루벤 다리오."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시는 하이브리드적인 시가 될 거예요. 소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끔찍하게 느린 속도로, 새로운 형태의 떨림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우연히 뭔가를 응시하겠죠. 의자에 파묻혀 자고 있는 시인의 작업 책상 위에서 말이에요. 의자 옆에는 낙타의 기생충을 먹고 사는 사막의 검은 새가 있고요. 말년의 어느 날, 브레통은 초현실주의가 지하로 숨을 필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도시나 도서관의 하수관 속으로 가라앉을 필요성에 대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주제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주하고 있을 시간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ㅡ Roberto Bolaño, [Entre paréntesis](91-93p), ANAGR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