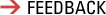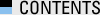Entre paréntesis
Entre paréntesis
오래 전 일이다. 어렸을 때 친구 한 명이 스페인어 현대 시 선집을 내게 소개해주었다. 영광스럽다기보다는 고통스럽게, 매년 주기적으로 출간되던 많은 책들 중 하나였다. 그 책은 칠레에서 만들어졌고 선집의 편집위원들 중 한 명은 가치 있는 시인이었다. 그 책의 특징은 최소한 절반 정도가 칠레 시로 구성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선집이 300페이지라면, 스페인 시가 30페이지, 아르헨티나 시가 20페이지, 멕시코 시가 20페이지, 우르과이 시가 5페이지, 니카라과이 시가 5페이지, 아마 페루 시는 10페이지 정도(그러나 마르틴 아단은 없었다), 콜롬비아 시는 3페이지, 에콰도르 시는 1페이지를 차지했다. 그렇게 150페이지 정도에 이르게 된다. 나머지 150여페이지에서는 칠레 시인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다녔다. 이 시 선집은 - 그 책의 이름이나 저자들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 당시 칠레 시가 자기 스스로 갖고 있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시인들은 가난했지만 시인이었다. 시인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시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 이후 칠레 시인들은 칠레의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왔다. (다섯 명의, 어쩌면 네 명일 수도 있고 세 명뿐일지도 모른는 위대한 시인들을 구하고 있는 올림푸스 산은,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성이 거의 없다.) 일렬로 서서, 마지못해, 벌벌떨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옛날 집인 그 유명한 "카사 데 라스 베카스(*보조금의 집?)"에, 잘나가는 작가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지켜보았다. 자기 스스로 소설가라는 둥, 여류 작가라는 둥, 신진 작가라는 둥 말하고 다니는 그런 작가들이 말이다. 최근에 그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쉽게 추측할 수 있듯,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마술적 어휘로 방세를 대신했다. (영화인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설가들은 현대적이었고, 그러므로 현대 사회가 지켜봐야 하는 실질적인 거울이었다. 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까지 시인들은 정성을 다해 묵시록적인 미학과 국가주의의 잔인함을 혼합시키는 작업을 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그들은 판매 순위의 명확함에 굴복하면서 시를 그만두었다. 칠레는 더이상 시의 나라가 아니다. 옛날에 나왔던 스페인어 현대 시 선집에 포함시킬 만한 현재 칠레 시인은 한 쌍도 떠올리기 힘들다. 당시엔 책의 절반 이상을 칠레 시인들이 독점했음에도. 지독한 무지, 툭하면 싸우는 편협함이 현재 칠레 소설에 남은 오직 하나의 유산이다. 시인들, 서른 살에서 쉰다섯 살 사이의 가난한 칠레 시인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는 건지, 그곳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멍한 상태로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악몽일 수도 있겠지만, 칠레에서는 좋은 점이다. 속임수와 핑계를 방편으로 획득한 문학의 위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시의 책무는 한 움큼의 먼지로 줄어들어버렸다. 지금 칠레 시인들은 다시 한 번 악천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를 읽을 수 있다. 칠레 시를 읽고 다시 또 읽을 수 있다. 그들이 썼던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몇몇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꽤 좋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ㅡ Roberto Bolaño, [Entre paréntesis](86-87p), ANAGRAMA
posted at
2011. 12. 1. 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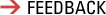 ::
::
 Entre paréntesis
Entre paréntesis
얼마 전에 나는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을 낭독하기 위해 베를린에 있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소설 번역자와 친구 하인리히 폰 베렌베르크로부터 시작하여, 베를린 사람들의 환대는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음식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밤낮으로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두 가지 사건만 제외하면. 첫 번째 일이다. 주최측에선 나를 반제 호수 근처에 있는 맨션에서 숙박하게 했다. 반제 호수는 도시 외곽에 있다. 그곳은 1811년에 폰 클라이스트가 불행한 여인 헨리에테 포겔과 함께 자살한 곳이다. 그는 사실상 새를 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못생기고 생기 없는 새였다. 어둡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 자신의 날개를 펼 필요가 없는 그런 새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스무 살 때 폰 클라이스트를 읽은 이후부터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홈부르크 왕자]를 떠올려보았다. 작가와 자신의 아버지 사이의 싸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싸움을 극화한 작품이었다. 아우스트랄 출판사의 선집으로 오래 전에 출간됐던 [미하엘 콜하스]도 떠올려보았다. 용기와, 용기의 쌍둥이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1806년에 출간된 [칠레의 지진]이라는 단편 소설도 생각났다. 우리는 여전히 그 소설에서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폰 클라이스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최측에선 나에게 다른 작가들도 그 맨션에서 숙박한다고 말하고는 열정적인 것에 대한 문화적인 활동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가 지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동유럽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으로 나가, 그 성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 어딘가에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술을 마신다고 알려주었다. 처음 숙박하던 날 나는 그곳에 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수도관처럼 생긴 일종의 우체통에다 방 열쇠를 넣어두었다. 방 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함께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 열쇠는 성에 접근할 수 있는 문 하나를 열 수 있었다. 과거에 종업원 방으로 사용된 곳의 문도 열 수 있었고 내 방 문도 열 수 있었다. 놀라웠다. 맨션엔 유령조차 없었다. 넓은 곳이었고, 홀에 깃발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하인리히는 그날 낮 동안 시대극이 촬영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깃발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른 홀에는 커다란 탁자가 있었고 또 다른 홀에는 켜지지 않는 낡은 철제 램프만이 덩그러니 있었다. 그곳엔 모든 곳으로 향하는 복도와 벽 높은 곳까지 드리운 음영, 어느 곳에도 다다르지 않는 계단이 있었다. 마침내 내 방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문이 열려 있고 벽에는 모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제 호수의 모기라니,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해충이었다. 파나마 강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자체로 이미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파나마 강에서든 아마존 강에서든 모기를 만나는 것은 귀찮은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당신의 방에 모기가 잔뜩 있는 걸 본다면 그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일 것이다. 불만이 가득한 채로 스프레이 모기약을 얻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으나 호수 옆에 있는 그 넓은 멘션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가들도 없었고 종업원들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 주에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발돋움 하여 소음을 내지 않으려 했고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모기를 잡았다. 마흔 번째 모기를 잡고 나서야 잡은 모기를 헤아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차마 창문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창문의 크리스탈 틈새로 코를 바싹 갖다댔다. 반제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폰 클라이스트의 유령이 어슴푸레 빛나는 모기 떼와 함께 춤추는 것이 보였다. 어쨌거나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나는 잠이 들었다.
베를린에서 본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더욱 더 강렬한 것이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녀의 차를 타고 비스마르크 거리로 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15미터가 채 못 되는 도로의 일부가 요렛 데 마르 거리로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ㅡ Roberto Bolaño, [Entre paréntesis](118-120p), ANAGRAMA
posted at
2011. 12. 1. 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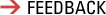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