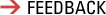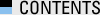아래 글에 '독신 기계'라는 말이 나온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들뢰즈의 용어인 것 같은데 들뢰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므로 검색을 해보았고 그마나 링크된 글이 읽을 만했으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전했으므로 아는 분 있으면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뿌잉뿌잉. 어쨌거나 아래 글에서는 '봄'이 '독신 기계'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봄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된다. 전반적으로... 망했다. -_-;
블라네스의 봄
블라네스에 봄이 온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심지어 마을 주민 중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오는 봄은, 웃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선을 연습한다. 마치 독신 기계가 된 것처럼 말이다. 말하자면, 주로 이해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는 기계이다. 그것은 마을에 도착한다.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바다나 산에서 올 것이다.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씨 뿌리며 열심히 일하는 야채 밭에서 오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랴.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고랑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던 중간에 멈춘다. 주민들 중 가장 무뚝뚝한 사람이 파리로 가득한 모퉁이에서 문득 멈추는 것처럼. 봄이 도착한 것을 보기 위해서이다. 그 독신 기계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 가장 불행한 아이들도 포함하여 - 더 잘 이해한다. 그게 전부다.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호안 데 사가라는 이렇게 말했다. 봄은 마을과 블라네스에 도착하여 블라네스 비야나 블라네스 수르 메르가 된다고. 우리의 작은 상상의 도시, 우리의 도시가 독신 기계의 변덕에 넘어갔다고. 봄은 어딘가에 도착했다. 비록 왜 출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봄이 어딘가에 도착한 걸 보면 바다가 놀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즉, 만약 사람들이 독신기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봄은 산트 호안 탑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 탑은 고딕 양식이며, 마을에서 영구적인 냉정함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마치 건물 구석구석에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블라네스에서, 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 호아킴 루이라의 내세관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나 브라바 해변의 새빨간 새우들이나 살아 있다는 것의 즐거움과 그것에 관해 전혀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 - 이 도착하기에 이상적인 입구이다.
ㅡ Roberto Bolaño, [Entre paréntesis](114-115p), ANAGRAMA
'Entre paréntesi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탈란어로 번역된 [페르디두르케] (2) | 2011.11.24 |
|---|---|
| 칠레 문학 (2) | 2011.11.24 |
| 회고록(Los libros de memorias) (0) | 2011.11.07 |
| 토메오(Tomeo) (0) | 2011.11.03 |
| 서점 주인(La Librera) (2) | 2011.10.28 |